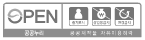동북아역사재단 2017년 02월호 뉴스레터
- 김민규 (동북아역사독도교육연수원 연구위원)
‘Oriental History’의 번역어인 ‘동양사’는 글자 그대로 ‘동양’의 역사를 말한다. 동양사학이라고도 하는데, 근대역사학의 한 분야다. 그런데 ‘동양’ 즉 ‘Orient’의 개념이 나라와 시대에 따라 달라 동양사의 개념을 특정하기란 쉽지 않다. 한국에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역사학에서 동양사를 (한)국사와 서양사로 구분해 사용한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해방 후 상당기간 동양사는 중국의 역사를 가리켰다. 중국에서는 동양이 일본을 칭하는 것이어서, 동양사라는 말은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중국사와 세계사로 나누고 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한국과 일본에서 동양사를 인식하는 방법은 매우 유사하면서도 상이하다. (경성제대 동양사학과가 근원인) 서울대의 경우 인문대학 내에 동양사학과가 있는데, 중국과 일본 그리고 베트남, 몽골, 동남아시아 등지의 역사를 학문의 범위로 삼고 있다. 반면 동경대의 경우 (문학부와 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의 통합 형태로) ‘동양사학연구실’을 두었는데, ‘동양사’와 ‘아시아사’를 엄연히 분리해 놓고 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한 의미로도 사용하기에 동양사의 ‘모습’은 적잖이 혼란스럽다. *
* 동양사학연구실’과는 별도 조직인 ‘동양문화연구소’에서는 ‘범아시아’ ‘동아시아 제1’ ‘동아시아 제2’ ‘남아시아’ ‘서아시아’ ‘신세대아시아’로 분류해 연구하고 있다.
자국 역사인식에 대한 혼돈으로 비화한 외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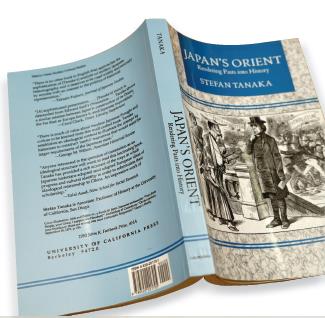
외국사, 즉 중국사를 기반으로 한 ‘동아시아의 역사’와 새로 등장한 서양사의 혼재는 곧, 일본의 자국 역사인식에 대한 혼돈으로 비화했다. 문명론의 관점에서 볼 때 자국보다 우월하다고 느낀 서양에 대응·대항하기 위해 자국의 독자성과 정체성을 역사 속에서 찾을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동시에 여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서양이 이미 지닌 것과 유사한 ‘우월성’이 자국 역사에도 존재함을 드러낼 필요 또한 생겼기 때문이다.
스테판 타나카(Stefan Tanaka)는 저서 《Japan’s Orient》(1993) 에서 일본의 그 필요성의 산물이 바로 ‘역사의 발견’이었으며, 그 역사는 다름 아닌 ‘토요시(To⁻yo⁻shi, 東洋史)’였다고 설파한다. 서구 중심주의의 발상을 전제로 하는 서양(=Occident)의 진보사관은 문명의 발달을 단선적으로 파악한다. 그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일본은 여타 아시아(=Orient) 국가처럼 서양에 비해 뒤떨어진 발전 단계에 영구히 머물게 된다. ‘오리엔트’의 일원인 일본이 그것을 극복하고 (‘오리엔트’에 대한 편견과 왜곡으로 점철된 서양의 인식과 태도를 지칭하는) ‘오리엔탈리즘’ 담론(discourse)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진보와 우월을 이야기할 수 있는 “꺼리” 즉 역사상(像)을 만들어내야 했는데 바로 그것이 ‘토요시’라는 것이다.
‘토요시’와 함께 정당화 된 일본의 아시아 침략
일본의 ‘동양사’ 산책‘토요시’에 진정한 ‘힘’을 싣기 위해 메이지일본은 기존 중국사를 기반으로 한 ‘동아시아 역사’를 해체(deconstruction)시킨 후 재구축(reconstruction)을 획책한다. 그 해체의 첫 작업은 ‘중국(=China)’ 대신 ‘시나(Shina, 支那)’라는 명칭의 사용이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중국’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한 ‘덩어리’를 중국이 형이상하학적으로 지탱해왔던 핵심인 (신)유학([Neo-]Confucianism)과, ‘시나’로 이분(二分)해 내는 것이었다. 진보적인 일본과 진취적인 성격의 일본인 상(像)은 사실 유학의 충효사상과 도덕을 (역성혁명을 부정하면서) 수용했던 때문이라고 서양에 어필해야 하는데, 유학의 종주국인 중국을 그대로 둘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다. 더군다나 중국이 바로 그 유학에 찌들어 멸망의 기로에 선 것이라고 격렬히 비판해야만 하는 모순적 상황에서는 더욱 더 그렇다. 그래서 발견해낸 것이 ‘시나’다. 기존의 중국에서 유학을 따로 떼어내고, 그 유학이 빠진 ‘중국’을 ‘시나’로 격하시켜야만 모순된 로직이 정합성을 띠기 때문이다.
분열과 쇠퇴 그리고 서양의 근대성(modernity)이라는 ‘빛’을 받지 못하고 유학에 찌든 채 미개라는 ‘몹쓸 병’을 앓고 있는 지금의 ‘시나’를, 조선을, 또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을, ‘토요’의 리더 일본이 마땅히 지도하고 지배할 수밖에 없다는 로직 아닌 로직을 만들어 내는 데에 ‘시나(=지리적 개념만 남은 중국)’는 당시의 일본인들에게 너무도 편리하고 유익한 ‘안성맞춤’의 담론이었다. 간단히 말해, 메이지일본이 ‘서양’으로부터 또 ‘중국을 기본으로 하는 아시아’로부터 자국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에서 창출해낸 것이 ‘일본의 오리엔트(Japan’s Orient)’ 즉 ‘토요(To⁻yo⁻, 東洋)’였으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행 도구가 ‘토요시’였다.
일본의 아시아 침략과 지배는 ‘토요시’와 함께 정당화되고 미화됐다. 그러나 ‘토요시’는 일본 최고액권인 1만 엔짜리 화폐 주인공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1901)의 ‘탈아론(=유학[=중국과 조선]에 대한 혐오와 부정)’이 웅변하듯, 애초부터 모순을 잉태하고 있었다. ‘토요시’가 암암리에 유학을 내세우는 반면, ‘탈아론’은 그것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의 어제와 오늘의 ‘역사 갈등’은 이미 ‘토요시’가 예고하고 있었다. 이제 그 ‘토요시’를 둘러싼 모순과 왜곡의 질곡에서 벗어나, 내일의 진정한 ‘동북아시아사(Northeast Asian History)’ 혹은 ‘동아시아사(East Asian History)’가 탄생하기를 고대한다. ‘세계사’로 나아가기 위한 전단계로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