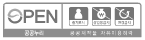동북아역사재단 2007년 12월호 뉴스레터
- 강원대 사범대학 국어교육학과 교수 김풍기
나의 정체성은 주변의 수많은 인연에 의해 구성된다. 절대적인 '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을 만드는 힘은 바로 '나'와 '나 아닌 것'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에 있다. 관계의 미학만큼이나 오묘한 이치를 가진 게 또 있을까 싶다. 각 항들간의 미묘한 힘의 형성 때문에 만들어지는 '관계'는 하나의 관점으로 해명하기 어렵다. 아무리 단순해 보이는 관계라 해도 그 이면에는 광대무비한 새로운 관계의 그물이 끝없이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그 무한한 관계의 그물 속에서 홀연 만들어지는 그물코가 바로 '나'가 아니겠는가.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따질 정체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새삼 느껴진다.
허망한 줄 알면서도 우리는 정체성 문제를 심각하게 따지고 고민해야 할 때가 있다. 무한한 관계의 그물 속에서 보면 하나의 그물코는 홀연 생겨났다가 홀연 사라지는 것이지만, 그물코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소중하기 그지없는 인연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물코의 위치를 확인하고 근거를 논의하는 일, 그리하여 무한한 세계의 관계들이 어떻게 얽히기 시작하는지를 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체성을 논의하는 첫 걸음이라 하겠다.
조선이 명나라에 대한 존중의 뜻을 보인 것은 건국 초기부터였다. 시대에 따라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기본적인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 그 입장에 큰 힘을 실어준 것은 임진왜란 발발 당시 명나라가 군사적 원조를 해준 사건이었다.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생각을 깊게 지배한 '대명의리(對明義理)'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명나라가 자신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조선을 도왔던 것은 복잡한 정치적 역학관계가 작용한 탓이리라. 그러나 도움을 받은 조선으로서는 너무도 고마웠을 것이고, 이 마음이 17세기 이후 북벌론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문제는 만주족의 흥기에서 발생하였다. 언제나 북방 오랑캐로 지칭하던 만주족의 나라가 힘을 모으더니 급기야 명나라를 강력하게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조선으로서는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처지가 되었다. 두 나라는 바로 명분과 실리를 상징하는 셈이었다. 명나라를 도외시하자니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에 위배되고, 청나라와 대적하자니 현실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자들과의 전쟁을 해야만 한다는 실리적 판단을 피할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17세기 조선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광해군 시대의 등거리 외교는 이미 널리 알려진 바 있지만, 우리는 그동안 그를 받치고 있었던 북인(北人) 정권 지식인들의 대(對) 중국 인식에 대해서는 그리 주목하지 않았다. 광해군 자신의 명민함 혹은 탁월한 외교 감각 덕분에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서 절묘한 줄타기를 할 수 있었던 점 역시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가의 운영, 특히 국가와 국가 사이의 외교적 문제가 군주 한 사람만의 탁견 때문에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왕을 보좌하고 있는 신료들의 중국 인식 역시 그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신병주, 정호훈 박사 등의 연구에서 일정 부분 드러난 것처럼, 북인 정권이 내세우는 이념적 푯대 안에는 국가의 유지를 위한 실리적 정책에 대한 고려가 강하게 들어있다. 그들은 물화의 유통, 상업 중시, 화폐 유통 문제 등과 함께 변방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군사력 혹은 변방 정비 등의 정책적 과제를 야심차게 기획하고 시행하였다. 그들이 명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 상대항에는 언제나 국가의 존망에 관련되는 실리적인 측면에 대한 중시가 동시에 자리하고 있었다.
실리를 챙긴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어떤 것이 우리의 이익인지 모르고 행동할 때가 많은 점을 생각한다면, 실리의 실질적 내용을 따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더욱이 실리를 얻는 것은 반드시 나 자신 외에 주변의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를 치밀하게 계산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나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주변 여러 존재들의 입장과 정세를 동시에 살필 수 있는 거시적 안목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그렇게 볼 때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서 조선의 이익을 지킨다는 것은 국제적인 안목과 광범위한 자료 섭렵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북인 정권을 유지했던 지식인들의 강점은 바로 이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넓고 날카로운 안목을 지니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역시 중국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과 함께 다양한 독서 이력에서 찾을 수 있겠다. 그 예로 우리는 이수광(李 光)을 들 수 있다. 그는 17세기 중요한 지식인 중에서 허균과 함께 방대한 독서를 자랑하는 인물일 뿐 아니라 세 차례 중국 사신으로 다녀온 경험을 바탕으로 넓고 섬세한 안목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사신으로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베트남이나 유구, 타이 등에서 온 외국 사신들과 교유를 하였으며, 중국의 서책을 다량 구입하여 가져오기도 하였다.
특히 세계지도를 통해서 중국과 교유하고 있는 동유럽 지역 국가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소개하였다. 이 같은 자료는 그의 『지봉유설(芝峯類說)』에 잘 정리되어 있다. 그는 이 책에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은 물론 투루판, 사마르칸트, 아라비아, 포르투갈, 네덜란드, 이탈리아, 로마 등 유럽 지역을 포함하여 50여 개국을 소개하고 있다.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를 인식하던 우리에게, 중국 너머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이수광과 같은 생각은 자연스럽게 실리를 중시하는 시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 명분은 언제나 도덕적인 것에 연결되기 마련이므로, 그것이 실리와 부딪치게 되면 실리는 알게 모르게 폄시되기 마련이다. 청나라의 현실적 세력을 도외시하면서 펼친 외교정책은 남한산성의 치욕을 낳았다. 물론 실리가 언제나 명분에 앞서는 것은 아니다. 도덕 원칙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실리가 실리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이다.
명분 없는 실리는 자신을 갉아먹는 악덕임에 틀림없다. 요점은 실리와 명분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넓은 시야와 세계적인 차원의 사고가 동반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17세기 지식인 이수광에게서 새롭게 배울 수 있는 점이 바로 이것이며, 나아가 같은 맥락에서 북인 정권의 외교적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중국을 꿈꾸며 사모하던 시기에, 그것을 넘어 다른 세계를 바라보는 이수광의 시선이야말로 경험과 공부의 힘에서 비롯된 것이다. 명분과 도덕 사이에서 끝없이 고민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 다양한 경험을 자신의 공부와 하나로 만들어 현실 속에서 구현하는 것은 17세기나 지금 우리 시대에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