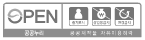동북아역사재단 2015년 11월호 뉴스레터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를 생각할 때마다, 필자는 늘 1988년에 나온 클라크 소렌센(Clark Sorensen)의 유명한 책 제목이 떠오른다.
《산 너머 산(Over the Mountains are Mountains)》으로 번역할 수 있는 그의 책은 1970~1980년대 산업화에 따른 우리나라 농촌 현실을 잘 파악한 명저 중 하나다. 물론 이 책의 내용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현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책 제목이 암시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자국을 둘러싼 국제 정치 환경 때문에 늘 어렵고 힘든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한반도 주변 상황을 고려할 때, 최근 중국의 급격한 부상이야말로 한반도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이의를 다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진부한 느낌마저 드는 동북공정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 북한의 핵 문제나 통일 문제를 언급할 때 이제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오히려 중국의 역할이 훨씬 더 커졌다는 생각은 굳이 필자만의 견해가 아닐 것이다. 이는 중국과의 오랜 단절기간을 생각하면 참으로 역설적인 상황이지만, 근래 중국의 위상을 부정할 방법이 없는 게 한반도를 둘러싼 현재 상황이다. 이런 탓에 크게는 정치·경제 문제를 비롯해 시시콜콜한 중국 관련 뉴스가 늘 우리 귓전을 때리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의 실상을 알기 위한 노력은 제한적이라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 중국 관련 연구는 신생 학문이라고 말하는 게 과장일까?
중국사 연구자로서 내가 이전 중국사 관련 논문을 읽다보면 일본 학자들의 연구를 인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1992년 중국과의 수교 이전에는 중국에서 나온 책을 직접 구해서 읽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외교 정상화로 자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국내 중국 연구자들은 중국과 수교를 환영했던 것도 사실이다. 정치적 제한이라는 장벽이 없어지고, 여기에 더해 정보 기술이 발달하여 이제는 연구실에 앉아서 중국 도서관 자료를 검토하고, 복사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이런 상황 때문에 특정 연구 자료를 구하지 못했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다수 중국 연구자들이 중국에 직접 찾아가 도서관에서 어렵게 자료를 복사한 일을 회상하면, 세상 변화가 정말 빠르다는 말이 새삼 실감난다.
부럽기만 한 유럽의 중국학 연구 성과 축적
필자는 최근에 프랑스의 이사벨 란드리-드롱(Isabelle Landry-Deron)이 쓴 《중국의 증거(La Preuve par la Chine)》라는 매우 흥미로운 책을 들춰보고 있다. 아직 꼼꼼히 읽지 않은 탓에, 자세한 내용을 소개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연구서의 근간은 예수회 선교사였던 장-밥티스트 뒤 알드(Jean-Baptiste Du Halde, 1674~1743)가 1735년 파리에서 출간한 《중국과 만주족의 지리, 역사, 연대기, 정치, 자연경관 서술》이라는 책을 다시 되새김질하는 데 있다. 이사벨 란드리-드롱은 이 책의 결론에서, 뒤 알드가 그의 저서를 당시 지식인들의 언어인 라틴어가 아닌 프랑스어로 출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뒤 알드가 당시 유럽인들이 중국에 흥미를 느낀 것이 단지 중국 도자기나 정원에 관심을 쏟을 때 보이는 '이국취향' 때문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이 중국과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다른 한편, 이사벨 란드리-드롱은 이 책을 통해 중국의 강희제(康熙帝)와 옹정제(雍正帝) 시대를 프랑스의 루이14세나 루이15세 시대와 비교하고자 했다는 원대한 포부를 피력하고 있지만, 오히려 필자는 프랑스나 서양의 여러 나라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룩한 중국학에 관한 축적이 새삼 놀라웠다. 정확히 말해 이사벨 란드리-드롱의 연구는 약 300년 전 뒤 알드의 저서가 아니었다면 결코 등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3세기 간격을 두고 동일한 나라에서 두 학자가 중국을 화두로 학문 교류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무척 부러웠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의 중국 연구 수준도 이제는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발전했지만, '축적'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긴 안목으로 학술연구 기반 구축에 매진해야
한 가지 예를 살펴보기로 하자. 앞서 말했듯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연구자들이 여러 자료를 복사하기 위해 중국으로 갔으며, 그런 자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명청시대에 다수 출간된 각 지역의 지방지(地方志)다. 물론 이런 지방지 상당수가 이제는 영인되었거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지만, 중국 정부는 지금도 이른바 '신편지방지'라는 명칭으로 지방지를 수없이 발간 중에 있다. 그리고 이미 서양인들은 2만 7천여 권에 달하는 1949년 이후 신편지방지 데이터베이스를 편하게 이용하고 있는 데 반해, 아마도 우리나라 다음 세대 중국 연구자들은 이 신편지방지를 복사하기 위해 다시 중국으로 날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엄연한 국책기관이며, 이런 점에서 운신의 폭이 좁다고도 할 수 있다. 최근 동북아역사지도 편찬에 관한 일련의 사태가 바로 그런 예이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하면 국책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연구자나 특정 사설기관이 선뜻 할 수 없는 장구한 계획 수립이 가능한 면도 있을 것이다. 한 예로 아직 동북아 전체나 중국 관련 전문 도서관이 없는 상황도 동북아역사재단과 같은 기관에서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일이다. 이런 장기적인 축적과 안목이 없으면, 우리는 늘 '산 너머 산'이라는 처지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마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