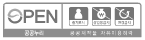동북아역사재단 2020년 05월호 뉴스레터
인과 관계를 밝히는 학문으로서 역사학이 지닌 강점 하나는 어떤 사건의 결과를 아는 상태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강점은 동시에 단점이기도 하다. 결과를 아는 상태에서 원인을 찾으니, 모든 결과가 필연으로 보이면서 사건이 일어나던 그때 그곳의 상황을 더 생생하게 감지하지 못하게 되기 일쑤다. 역사학자라면 늘 조심해야 할 회고적 전망(retrospective perspective)의 함정이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 끝자락에 일어난 현실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를 더 깊이 살펴보려면 이 회고적 전망에서 벗어나야 한다. 1991년 12월 26일에 이루어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해체가 단순한 필연적 사건이었다면, 그 사건을 예견하는 이가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1988년 5월 바르샤바대학 정문 근처에서 폴란드 대학생들이 반공 시위를 하고 있다. ⓒRafał Werbanowski
<철옹성 체제의 느닷없는 붕괴>
“소비에트 연방에서 무언가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사라질 거라는 생각은 고사하고요. 누구도 그걸 기대하지 않았어요. 어른이건 아이건 말이에요. 모든 게 영원할 거라는 완전한 인상이 있었죠.”
소련에서 태어나고 자란 알렉세이 유르착(Alexei Yurchak) 이 2005년에 펴낸 책 <모든 것은 영원했다, 사라지기 전까지는: 소비에트의 마지막 세대>에서 지난날을 돌이켜보면서 한 말이다. 소련의 해체를 예상한 이는 거의 없었다. 모순투성이였을지라도 현실 사회주의가 그때에는 견고하고도 안정된 체제로 보였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여기서 생각나는 이가 있다. 2012년에 작고한 20세기의 위대한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Eric Hobsbawm)이다. 1987년 5월에 그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역사를 공부하겠다고 마음먹은 학부생이었던 필자는 강연장을 찾아갔다. 홉스봄이 강연을 마친 뒤 ‘소련의 앞날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소련은 무척 안정적인 체제이므로 붕괴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답변하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4년 반 뒤에 군인이었던 필자가 내무반에 들어갔는데, ‘소련 해체’라는 큼지막한 국방일보 1면 표제가 눈에 띄었다. 그 순간 ‘아무리 국방일보지만 이렇게 큰 오보를 내도 괜찮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오보가 아니었다. 풋내기 역사학도가 흠모해 마지않던 홉스봄의 냉철한 혜안도 인류의 지난날이 아닌 앞날을 보는 데에는 통하지 않았던 것이다. 외부의 관찰자였던 홉스봄이 그랬으니 내부에 있던 유르착은 오죽했을까!
영원할 듯 보이다가 한순간에 허물어진 소비에트 체제의 기원인 ‘러시아 혁명’도 다르지 않았다. 러시아 혁명사를 전공한 필자도 1917년 러시아에서 일어난 격변을 필연으로 간주하고 오래도록 그 원인을 연구해왔지만, 정작 당대인들은 그 격변을 전혀 감지하지 못 했다. 철옹성처럼 보이던 러시아 전제정이 하릴없이 허물어지기 겨우 몇 달 전 스위스 망명지에 있던 블라디미르 레닌조차도 ‘나는 살아생전에 혁명을 보기 힘들겠다’며 후배 혁명가들에게 푸념을 늘어놓았다. 그로부터 한 해가 채 지나기도 전에 러시아로 돌아가 ‘세계를 뒤흔든’ 1917년 10월 혁명을 자기가 이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이쯤 되면 예고도 없이 체제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은 러시아의 역사에서 하나의 경향이나 패턴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아무리 인류사의 대격변이 예측을 허용하지 않는다 해도, 지나고 보면 그에 앞서 숱한 조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냉전 시대에 미국과 맞서며 세계를 주도한 공산주의 체제의 종주국인 소비에트 연방이 공중분해 되기 바로 앞서, 동유럽의 여러 사회주의 국가들은 열병처럼 격동의 변화를 겪었다.
<동유럽에 부는 변화의 바람>
나는 모스크바를 따라 고르키 공원까지 갑니다
8월의 어느 날 밤에 변화의 바람이 내는 소리를 들으면서요
군인들이 지나갑니다.
변화의 바람이 내는 소리를 들으면서요…
변화의 바람이 시대에 맞서 곧바로 붑니다
자유의 종을 울릴 폭풍처럼요
독일의 록 밴드 스콜피언스가 1991년 1월에 발매한 ‘변화의 바람’(Wind of Change)의 노랫말이다. 전 세계에서 엄청난 인기를 끈 이 노래에는 마흔 해 가까이 세계를 옥죄어온 냉전의 끝자락에 일어난 변화가 반영되어 있다. 입에 발린 말로 하는 찬사가 아니다. 1989년 8월 12~13일 ‘동토의 땅’이라는 소련의 수도에서 열린 모스크바국제음악평화축전에 직접 참여하며 영감을 얻어 만든 곡이기 때문이다. 예술가라서 그런지 스콜피언스는 변화의 기운을 머리보다 몸으로 먼저 느낀 듯하다.
실제로 동유럽에는 아주 거센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1989년 5월에 헝가리인민공화국과 자본주의 진영에 속한 오스트리아 사이에 왕래가 허용되면서 소위 ‘철의 장막’에 큼직한 구멍이 뚫렸다. 이를 알아차린 독일민주주의공화국(동독) 시민들이 1989년 늦여름부터 ‘사회주의 형제국’인 헝가리로 가서 오스트리아를 거쳐 ‘보수반동의 나라’이자 금단의 땅이었던 독일연방공화국(서독)으로 들어갔고, 급기야 11월에는 냉전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진 뒤 아무런 제지 없이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을 넘나들 수 있었다.
한편, 1968년에 맛본 ‘프라하의 봄’ 뒤에 여름이 아닌 기나긴 겨울을 맞이했던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벨벳혁명(Velvet Revolution)이 일어나 1989년 12월에 극작가이자 반체제 인사인 바츨라프 하벨(Vaclav Havel)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폴란드에서는 레흐 바웬사(Lech Walesa)가 이끄는 자유노조운동이 공산당의 탄압을 뚫고 민심을 얻었으며 바웬사는 1990년에 대통령이 되었다. 스탈린 체제를 넘어설 만큼 극도의 폭압적인 통치로 국민의 숨통을 조이던 루마니아에서는 노랫말 그대로 폭풍이 불었다. 철권을 휘둘러온 니콜라에 차우셰스쿠(Nicolae Ceausescu)가 민중 봉기로 타도되면서 1989년 12월에 목숨을 잃은 것이다.


체코슬로바키아와 루마니아의 혁명 과정을 보여주는 기념우표
ⓒOleg Golovnev / Shutterstock.com
ⓒneftali / Shutterstock.com
<동유럽의 역사적 위상>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며 현실 사회주의 체제가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지는 격변의 조짐은, 앞서 동유럽에서 나타난 일련의 격동에서 엿보였다. 그러나 동유럽 체제의 변화를 소련에서 일어난 격변의 조짐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소련/러시아 위주라는 비판을 받기 쉽다. 동유럽 국가를 주체로 여기지 않고 소련/러시아에 종속된 변수로만 파악하는 시각에서 비롯된 편견인 셈이다. 물론, 동유럽과 소련/러시아는 상호작용하고 있었으므로 이 둘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언제나 동유럽은 초점에서 비켜나 있었다. 기껏해야 40년 남짓한 냉전 시대에 국한되었어야 할 ‘위성국가’라는 위상이 유구한 동유럽 역사에 투사되어 만들어진 뒤틀린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명색이 유럽사 전공자인 필자에게도 동유럽의 이미지는 선명하지 않다. 한 번은 새로 맡은 강의를 준비하며 동유럽 역사를 세밀하게 살펴보았다. 서유럽의 경우에는 국가는 물론 도시의 위치까지도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동유럽의 경우 국가의 위치마저 헷갈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랐던 적이 있다. 그만큼 동유럽은 낯설다. 하지만 서유럽 못지않게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다.
동유럽은 서유럽보다 뒤떨어진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근대 이전의 상황은 다르다. 서양의 중심이 지중해이던 시기, 동유럽은 신흥 지역인 서로마 제국을 압도하는 힘과 문화를 지닌 동로마 제국 권역에 속하였기에 동지중해의 활력을 흡수하며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근대에 접어들어 경제의 중심이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옮겨가면서 동유럽의 맥동은 느려졌고, 18세기에는 서유럽의 반주변부 혹은 주변부로 전락했다.
사실, 동유럽은 오래전부터 게르만계 민족의 잠식 대상이었다. 일찍이 1242년 노브고로드의 알렉산드르 넵스키(Aleksandr Nevskij) 대공이 이끄는 슬라브인이 페이푸스 호수의 얼음 위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튜튼 기사단 군대를 물리쳐 게르만인의 동진을 막아냈지만, 이 사건은 ‘서양판 서세동점’의 연원이 800년 안팎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동유럽 일대에 스며든 게르만인은 현지인을 아우르고 때로는 억누르며 사회의 상층부에 포진했다. 이런 까닭에 동유럽의 유수한 귀족들이 독일계 성(姓)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민족과 계급이 서로 얽혀 구성되고 복잡했던 탓에 19세기 후반 동유럽에서는 인권과 제도가 아니라 인종과 종교에 바탕을 두고 민족(nation)이 정의되기 시작했다. 이에 동유럽의 민족주의는 휘발성과 폭발성이 강한 분쟁의 요소를 안게 되었다. 20세기 전반에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끔찍한 잔학 행위가 저질러진 공간이 동유럽이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동유럽의 과거와 미래>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사이에 동유럽에서 벌어진 파란과 격동의 근원은 제2차 세계대전에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하면 대개 동아시아(태평양) 전선과 유럽 서부전선을 떠올리지만, 이 거대한 전쟁의 주 무대는 독일과 소련이 격돌하는 유럽 동부전선이었다. 1941년 11월 모스크바까지 빼앗길 위기에 몰렸던 스탈린은, 거의 모든 세계인의 예상을 뒤엎고 1945년 4월에 히틀러를 물리쳐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제2차 세계대전, 특히 독소전쟁(獨蘇戰爭)은 동유럽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독일인에게 복수심을 불태우는 붉은 군대가 동진하자, 동유럽에 있는 독일인과 독일계 주민은 모두 다 겁에 질려 서쪽으로 도주했다. 지난 3년 동안 나치 독일이 소련 인민에 저지른 잔인무도한 만행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 과정에서 장장 8세기 동안 동유럽에서 뿌리를 내렸던 게르만적 요소가 8개월도 채 안 되어 폭력적으로, 그러나 깨끗이 청산되었고, 발칸 반도 일대를 제외한 동유럽 일대의 민족 구성이 단순해졌다.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제2차 세계대전의 중요한 결과이다.
그러나 독일인이 빠져나가면서 생긴 진공을 메운 것은 간결해진 민족 구성을 발판 삼아 각자 도약할 동유럽의 국민국가가 아니라 러시아의 영향력이었다. 1812년에 프랑스의 나폴레옹에게, 1941년에 독일의 히틀러에게 처절히 당한 경험으로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은 러시아는, 동유럽을 유럽 서방의 침략을 막아줄 완충 지대로 삼아야 한다는 강박을 떨치지 못했다. 그 결과, 소련은 새 출발을 할 가능성을 얻은 동유럽 국민국가의 주권을 존중하기보다는 자국의 안보를 위한 위성국으로 삼았다. 독일을 밀어내고 들어선 러시아가 억지로 유지해온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는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흔들리다 변화의 바람에 날려 허물어지고 만다.
그러나 참으로 얄궂은 사실은, 소련의 몰락으로 발생한 동유럽 일대의 진공을 메우는 것이 독일 주도의 유럽 연합이라는 점이다. 이번 차례의 ‘서양판 서세동점’은 우크라이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러시아는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몇 해 전, 크림반도의 독립을 둘러싸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충돌한 사건은 이런 사정의 연장선에서 빚어진 비극이다. 동유럽에 부는 변화의 바람은 시차를 두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 방향이 바뀌고 있다. 앞으로도 풍향이 바뀔 때마다 동유럽이 풀처럼 이리저리 흔들릴지, 아니면 꿋꿋이 버텨내고 묵직한 나무로 자라날지 지켜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