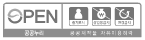동북아역사재단 2010년 09월호 뉴스레터

928년 전 오늘의 일이다. 중국 남송(南宋)의 저명한 문호인 소동파(蘇東坡)는 삼국시대 조조와 손권이 한바탕 격전을 치렀던 적벽(赤壁) 아래에서 친구와 함께 배를 타고 술판을 벌렸다.
그도 술을 마셨고 나도 술을 마시지만, 역사책에 이름을 남긴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나는 술자리 뒤에 항상 숙취로 고생하거나 때론 기억조차 잃지만, 저 이는 술판의 끝을 천하의 명문으로 정리하였으니 말이다.
적벽부는 내가 학창시절에 늘 입가에 달고 살던, 말하자면 내가 꼽는 베스트 문장이다. 적벽부를 좋아하는 이유는 내 마음의 한 자락이 대문호의 정신세계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이 글을 좋아하는 이유는 매우 단순하게도 그 끄트머리에 매달려 있는 근사한 구절 하나 때문이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하늘과 땅도 한 순간의 것이고,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바라보면 천지간의 사물이나 나 자신까지 무궁하니 또 무엇을 부러워하겠는가(蓋將自其變者而觀之, 則天地曾不能以一瞬, 自其不變者而觀之, 則物與我皆無盡也, 而又何羨乎)"멋있지 않은가!
꼬투리 잡기 좋아하는 친구는 극단적인 상대주의라고 하고, 그렇게 보면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하여, 서슬 퍼런 비평의 잣대를 들이대었지만, 고백컨대 나는 이 한 구절로 유난히 길고도 힘들었던 학창시절을 버텨낼 수 있었다. 급할 것도 없고 서두를 일도 없었다. 무궁한 우주 속에서 내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면 그것으로 그만이었다.
내 호흡이 길면 길수록 이 세상의 호흡도 깊어지리라는 생각이, 여차하면 나를 설익게 할 주범이 됐을지도 모르는 파에톤의 젊은 조급증을 고요하게 잠재워 주었다.
백두산과 장백산, 같은 산이되 다른 산
중하(仲夏)의 초입에 백두산에 다녀왔다. 해일처럼 밀려오는 거친 원시림의 바다 저 끝에서 그는 예전부터 그랬듯이 고요한 시선으로 날 내려 보고 있었다. 천지의 물결이 해맑게 반짝이고 있었다. 어린 시절, 말로만 듣던 할머니댁에 처음 도착했을 때 느꼈던 바로 그 기분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정말 그랬다. 처음으로 거기에 갔지만, 그곳은 영락없는 나와 내 아버지의 고향이었다. 푸근했으며 편안했다. 말 걸고 싶었고 장난치고 싶었고 투정부리고 싶었다.
백두산은 중국인들로 들끓었다. 드문드문 귀에 들어오는 저들의 어지러운 대화 속에서 그들 또한 저의 웅장함에, 그 신비함에 적잖이 감탄하고 있음을 눈치 챌 수 있었다.
중국이라면 나도 어지간히 돌아다녀 보았지만, 다른 어디에서도 백두산과 같은 장엄한 산세를 볼 수 없었다. 중국인들이 백두산을 저들의 십대명산(十大名山) 반열에 올려놓은 이유를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백두산은 장백산일 따름이다. 화산작용으로 형성된 용암대지일 뿐이며, 조선족과 만주족의 기원설화를 간직한 변경의 고산(高山)에 불과하다. 그들과 우리의 심성 속에서, 백두산은 똑같은 산이지만 엄연히 서로 다른 산이기도 한 것이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고향에 가기 위해서 중국 땅을 밟아야한다. 그러나 너무 아쉬워하지는 말자. 우리가 그곳을 그리워하는 한, 그리고 나의 혈맥이 계속되는 한, 나와 나의 아버지, 그리고 내 할아버지에게 그랬듯이, 나와 내 아들, 그리고 내 손자에게도 백두산은 변함없이 우리의 고향일 것이다. 조급해 하거나 성 낼 이유는 더욱 더 없다. 천지간의 사물도 나 자신도 무궁할 터인데 서두를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