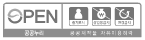동북아역사재단 2014년 04월호 뉴스레터

"우리가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며 지금 해야 할 일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망국의 한에 그토록 머물러 있을 필요도 없고, 강대국의 엄습에 그리 가위 눌릴 일도 없다"
역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자기가 살던 시대가 격동기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역사의 어느 순간인들 편안한 날이 있었을까만, 내 시대가 더욱 절절하게 느껴지는 것은 가까운 기억이 더 선명하기 때문인 탓이지 유난히 '오늘'이 더 격정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대사가 더욱 격동으로 느껴지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망국, 일제 강점기, 해방과 함께 분출한 지나친 자유 의지, 복수심, 그리고 조속한 독립과 통일을 기대하는 군중심리, 그 뒤를 이은 한국전쟁과 4·19혁명, 군사정부, 민주화를 위한 아픔 등 한국의 현대사 100년은 지난날 몇세기에 걸친 경험보다 더 치열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나타난 첫 번째 민족 정서는 분노였다. 역사에서 어느 민족인들 환난과 굴욕이 없겠냐만은, 우리 역사는 더욱 간고(艱苦)했다. 수많은 외침을 받은 역사가 할퀴고 간 뒤에 남은 것은 굴욕과 회한의 애상(哀傷, pathos)이 많았다. 더욱이 우리는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한국이 왜 왜(倭)에 멸망했는지에 대한 분노를 삭일 수가 없었다.
역사, 더불어 사는 것을 가르쳐야
한국사가 비분강개의 역사로 흐른 이유는, 한일강제병합을 통한 망국의 한(恨) 때문이라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당시 역사가들은 개국 이래 최악의 비극 앞에서 울분을 토하는 심정으로 역사를 기술했다. 예컨대 장지연의 "오늘, 이날을 목 놓아 통곡한다(是日也放聲大哭)", 박은식의 '한국의 비통한 역사(韓國痛史)'나 '한국 독립운동의 피어린 역사(韓國獨立運動之血史)', 그리고 단재 신채호의 '의열단선언'과 애국주의 전기 문학이 이에 속한다. 이들은 비감한 심정으로 민족의 슬픔과 야망과 기백을 강조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일제시대사는 결과적으로 세 가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첫째, 그들은 일본의 잔학상을 강조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그러한 역사 기술은 제 허물을 돌아보기보다는 망국의 책임을 일본에게 돌리는 '탓의 역사학'이 되었다. 둘째, 국수주의 역사학으로 분류되는 이러한 입장은 적개심 유발을 시도했다. 일본에게는 축구도 져서는 안 된다. 역사는 더불어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지 적개심을 수련하는 장이 아니다 셋째, 비분강개의 역사는 우국심을 요구했다. 역사주의자들은 순교자적 죽음을 찬미했다. 그러한 비분강개의 역사 맨 앞자리에는 정몽주가 서 있고, 그 뒤를 이어 사육신과 삼학사와 이준이 자리 잡고 있다. 그들의 공통 관심은 국가에 대한 절의(節義)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죽음은 "네덜란드 방파제 소년의 죽음"이라는 지어낸 이야기와 "악법도 법"이라며 독배를 마시고 소크라테스가 죽었다는 과장된 이야기를 교과서에 싣는 것으로 확대 재생산되었다.
민족주의를 넘어서 합리적인 역사인식 필요
이와 같은 민족주의적 호소가 우국심으로 승화하여 초기 국민국가 형성에 중요한 에너지가 된 것은 사실이다. 부족한 부존자원과 국가 시설의 미비, 기술 부족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내핍과 초과 노동, 국산품 애용 등의 자기 희생을 유발하는 길은 애국심에 호소하는 길밖에 없었다. 그와 같은 호소를 통하여 국민들은 카리스마적 지도자를 받아들이고 그를 중심으로 뭉쳐 민족적 동질성을 구축하는 동력을 얻었다. 이승만과 박정희 시대는 그런 역사 상황이 낳은 진통의 시기였다. 대체로 그러한 역사 분위기는 50년 이상의 시효를 넘지 못했다.
그러나 광복 70년을 바라보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분명한 것은 우리 역사에서 분노에 찬 민족주의가 덕목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러시아혁명기에 고뇌하던 청년 네크라소프(Nikolai Nekrasov, 1821~1878)의 절규처럼 "슬픔도 분노도 없는 사람은 조국을 사랑할 수 없다" 그 말이 맞던 시절이 있었다. 그 군핍(窘乏)의 시대에 그러한 분노와 결연한 의지마저 없었더라면 우리는 무슨 힘으로 그 아픔을 견딜 수 있었을까? 그러나 세계 10위권에 드는 문명국으로 발전한 지금 우리는 조금 빗겨 서서 우리가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며 지금 해야 할 일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망국의 한에 그토록 머물러 있을 필요도 없고, 강대국의 엄습에 그리 가위 눌릴 일도 없다.
나는 요즘 일본의 막부 말기 지식인이었던 니시 아마네(西周, 1829~1897)의 충고를 화두처럼 되뇌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막부와 유신의 교체기에 격동하는 조국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식인은 그 시대 민중들이 앓고 있는 열을 식혀주는 해열제(kinine)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분노할 일이 너무 많다. 그러나 역사는 늘 그러했다. 분노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심할 수만도 없다. 그럴 때면 나는 알프레드 마셜(Alfred Marshall, 1842~1924)이 1885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경제학 교수로 발령받고 취임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부탁한 다음의 구절로 마음을 달랜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학생들이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