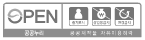동북아역사재단 2009년 12월호 뉴스레터

10월 16, 17일 양일간 연변대학에서 열린 제2차 두만강 포럼에 다녀왔다. 연변대학 개교 60주년 기념식을 겸하여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남북한과 중국에서 80여명의 학자들이 참여하여 "다원적 공존과 변연(邊緣)의 선택을" 주제로 활발한 발표와 토론이 전개되었다. 특히, 그동안 휴면상태에 있던 두만강개발계획에 중국 정부가 다시 전략적 관심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는 내게 각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역시 만남은 값지고 대화는 소중한 것이었다. 귀동냥만으로도 참으로 다양한 사고와 발상의 전환을 위한 단서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두만강 지역에서 남북한과 중국 사이 평화의 공간을 만들어야 하며, 이러한 다원적 공간 전략이 중국이 진정으로 세계적인 리더십을 확보하는 길임을 주장하고자 했던 나의 글은 북측의 "검열" 속에 사장되었다. 개혁과 개방 운운한 글을 발표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경제협력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평화가 아닌 평화를 위한 협력, 즉 '평화를 위한 기획'이 절실하다는 나의 주장은 북측의 차가운 시선 속에 일단 생존을 위한 유산(流産)을 가장할 수밖에 없었다. 여건의 성숙과 사고의 보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위무하며, 연변의 변화와 공생의 방법론을 듣기 위해 숨차게 발품을 팔아 책방을 찾고 지인들을 만나보았다.
"백두산석마도진(白頭山石磨刀盡) 두만강수음마무(豆滿江水飮馬無)"하며 여진을 평정하겠다던 남이(南怡)는 역모의 누명을 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공존의 질서를 통한 평화"라는 현재적 접근과는 다르지만 일단 북방에서의 안녕과 평화는 이뤄지지 못하였다. 그리고 남북이 갈린 오늘 이곳에서의 평화는 여전히 살얼음처럼 위태로와 보인다. 파인(巴人) 김동환이 묘사한 "전선이 잉잉우는" 국경의 살풍경함도 그가 살던 당시와 그다지 달라 보이지 않는다. 다만 지금은 "봄이 와도 꽃 한 폭 필 줄 모르는 강건너 산촌"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동토의 땅을 등지고 야음을 틈타 두만강을 건너고 있는 것이 다르다면 다를까? "아하, 무사히 건넜을까/ 이 한밤에 남편은/ 두만강을 무사히 건넜을까"라는 가위눌림 속에 숨죽이고 있을 내 핏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어떻게 역사의 강을 건널 것인가
근래부터 해양에 대한 진취적 사고의 쇠퇴, 북방 전략공간에 대한 무지와 편견이 우리 역사의 수많은 좌절을 초래해 온 원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두만강 지역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이 지역은 또다시 동아시아 세력균형의 향배를 가를 전략공간으로 부상하고 있고, 그만큼 우리가 안아야 할 '국경선 압력'도 커질 것이다. 과연 이 지역에 거대하게 운집하고 있는 역사적 에너지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인가? 남과 북이 갈린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어떠한 평화의 전략과 방법론을 세워나갈 것인가? 시인의 조바심처럼 우리는 어떻게 두만강을 무사히 건널 것인가?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그대만의 신비한 이유"를 노래한 휴대전화 컬러링의 볼륨을 한껏 키워보았다. 그리고 두만강에 평화의 꿈을 산란할 '나의 연어'를 놓아 보겠다는 완강한 내 안의 소망을 보듬고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기댔다. 보고 들은 얘기를 메모한 수첩을 뒤적여 한 줄을 더하고 밑줄을 그었다. '평화를 위한 기획'에 대한 확집(確執)을 눈물겹게 되새기며 비겁한 역사의 꺼삐단 리가 되지 않겠노라고.
※ 「꺼삐단 리」는 변혁기의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풍자한 1962년 전광용의 단편소설. 캡틴(Captain)의 러시아 발음이 우리식으로 변용된 것임.
※ '역사에세이'는 재단 연구위원들이 쓰는 자유로운 형식과 내용의 칼럼입니다. _ 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