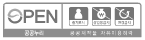동북아역사재단 2013년 06월호 뉴스레터


'독도.....' 이름만 들어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응어리져 있던 것들이 올라오는 것 같고, 외마디 고함이라도 질러야 속이 풀릴것 같은, 내 마음을 울컥하게 만드는 애국심의 '샹그릴라'
물론, 이런 나의 감정은 유년기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독도의 역사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역학관계에 눈을 떠가면서 점점 자라난 나의 성장과 관련 깊다. 어릴 적에는, '울릉도 동남쪽∼'으로 시작하는 정광태님의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끝까지 외워 부를수 있으면, 경제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독도에 직접 가보는 것이 불가능했던 시절이었던 만큼, 독도에 대해선 거의 다 아는 것으로 치부했었다. 이제는 세월이 좋아져서, 누구라도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약간의 돈과 시간의 여유가 있으며, 독도의 날씨만 허락된다면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되었다. 나의 경우엔, '시간을 내기 힘들다.'는 것이 독도에 가보지 못한 주된 핑계였다. 기실 비용의 문제가 만만치가 않았다. 인터넷을 뒤져서 가장 저렴한 관광회사를 선정해서 간다 하여도 가족 모두가 함께 가기에는 내 월급 중 상당부분을 할애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 내부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 내부그리고 (역시나) 세상이 좋아져서, 시간과 돈을 절약하면서 독도에 가본 것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체수단이 잘 갖춰져 있다.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동북아역사재단)에 가면, 독도 실물을 20분의 1로 축소하여 눈 앞에 가져다 놓은 '독도체험관'이 있고, 인터넷으로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의 '독도지리넷' (http://dokdo.ngii.go.kr)을 치면, 독도 구석구석을 '3D'로 샅샅이 훑어볼 수 있도록 잘 꾸며 놓았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 자판에 '독도'라고 치는 정말 약간의 수고를 감수한다면, '주르르륵'하고 독도와 관련된 사진, 지리, 역사 등 정보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져 나온다.
독도에 한 발짝도 안 가본 사람이라도 독도에 가 본 사람보다 더 많이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속 좁은 속물은, 비록 자신의 집 지하실에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잘 베껴서 아침저녁으로 보면서 산다고 하더라도, 루브르 미술관에 가서 진품 '모나리자'를 봐야만 자신있게 '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이 '모나리자'도 제작 당시의 완벽한 모습이 아닌데도 말이다. (실물 모나리자는 때때로 세정(洗淨)도 하고, 광택용 니스를 바르기도 해서 그림 전체에 균열이 생겨 처음 그릴 당시의 시원스럽고 여유있는 필치는 볼 수 없다고 알려져 있다.) 나 또한 그렇고 그런 속물이었다. '독도체험관'에 가보고, '독도지리넷'도 훑어보고, 시간만 나면 '독도'를 검색해 보았지만, 오리지널이 주는 감흥이랄까 아무튼 뭔가가 부족한 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남아 있었다. 그러던 중, '동북아역사재단' 주관으로 2013년 5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탐방하는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찾아왔다.
5월 1일 새벽 3시 시청역 3번 출구에서 강원도 묵호행 버스를 타고 8시 20분발 울릉도행 쾌속선에 몸을 실었다. 공교롭게 이 날은 너울이 심해 같은 배를 탄 많은 사람들이 배멀미로 선실 바닥에 누워서 가야만 하는 등 고생이 심했다. 심지어 일행 중 한 사람은 다음날 배로 들어가야 하는 독도 입도를 포기한 사람이 나올 정도였다.
울릉도에서 숙소를 잡고, 조선 고종 시대 '울릉도검찰일기'를 남겨 울릉도 개척의 기반을 닦은 이규원 감찰사의 발자취를 따라 소황토구미, 학포, 나리분지, 도동항 등을 중심으로 둘러보았고, 둘째 날 오후 울릉도 사동항에서 '독도평화호'에 승선, 두 시간 여의 항해 끝에 마침내 독도선착장에 발을 내딛었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km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 최동단.물 위로 보이는 봉우리(최고 높이는 서도 168.5m, 동도 98.6m) 보다 그 밑에 감춰진 역사의 크기가 비할 데 없이 거대한 곳. 그래서 항상 가슴을 아련하게 만드는 섬.
과연 실물에 필적할 수 있는 모사품은 이 세상에 없었다. 독도체험관에선 볼 수 없던 '괭이갈매기'들이 여기저기서 방문객들을 반기는 눈길을 보내고 있었고(실제로는 경계의 눈초리가 틀림없을 것이지만), 발길 닿은곳마다 사연과 전설을 간직한 '탕건봉', '촛대바위', 바위에 새겨진 '韓國領' 등등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낯설었으나 낯익은 것들이었다. 불현듯 가족이 생각났다. 집사람과 다섯 살 배기 늦둥이 딸이 눈에 밟혔다. 오늘 가슴 충만한 독도 입도에서 남는 아쉬움이라면 이것 하나였다. 사진이라도 보여주려 70도 경사지를 냉큼 오르며 바쁘게 셔터를 눌렀다. '다음엔 꼭 같이 오리라.'
한 시간여의 독도와의 만남을 뒤로하고 울릉도로 돌아오는 배에선 좀처럼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마치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도 된 것 마냥, 남들이 가보지 못한 미지의 신세계를 다녀온 듯한 여운이 계속 맴돌았다. 눈을 감았다. 저만치서 '독도는 우리 땅'을 부르는 나이 먹은 소년이 보이기 시작했다. 옆자리에 앉은 일행이 내 입가에 알 듯 모를 듯 미소가 번지는 것을 눈치 챘는지 지금도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