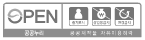동북아역사재단 2024년 06월호 뉴스레터
- 한봉석 국립부경대 교수
한국전쟁과 그래함 프렌치 씨의 자선
한봉석 국립부경대 교수
기아와의 전쟁 이후에도 더욱 굶주리는 세계
1960년대 중반 미국 린든 존슨 대통령은 미 의회에서기아와의 전쟁을 선언한 바 있다. 그 후 국제사회는 세계의 기아를 없애고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현재 세계의 아이들은 과거보다 더 굶주리고 있다. 왜 그럴까? 한국전쟁 당시 한국이 받았던 구호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1950년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한국은 세계 구호단체의 각축장이 되었다. 한때 123개 단체가 내무부에 등록되었고, 전 세계의 도움이 답지했다. 물자는 넘쳤다. 그러나 1970년대에 통일벼가 생산되기 전까지 한국은 식량 자급을 이루지 못했다. 오늘날 국제사회 구호의 허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주한 케아와 미국 독지가의 따뜻한 사연들
The Newyork Times, 1959년 4월 6일자에 강원도 신철원읍의 한 마을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미국인 그래함 프렌치(Graham French)라는 독지가가 자선단체를 통해 38선 인근 마을에 구호의 손길을 보냈고, 그 덕분에 이 마을이 부흥했다는 이야기였다. 어느 제약회사 창립자의 손자인 그는 크리스마스 선물 대신 해외의 빈곤한 이들에게 선물을 보내기로 결심했고, 이윽고 케아(C.A.R.E)라는 단체를 만나 결실을 맺었다고 했다.
케아(the Cooperative for American Relief Everywhere)는 원래 유럽 지역 구호를 위한 단체였다. 1979년에 한국 사업을 마감하기 전까지 주로 ‘C.A.R.E Package’라고 쓰인 구호물자를 통해 사업했다. 미국 내 민간인 단체의 선의를 모아 구호 물품을 보낸다는 콘셉트였기 때문에, 유난히 평범한 미국 사람들의 기부가 많았다. 초대 사절단장인 로버트 페어그레이브는 도쿄로 피난 가는 순간까지 직원의 월급과 성과급을 챙기는 등 한국에 깊은 애정을 보였다.
그 외에도 독지가의 따뜻한 사연들은 많았다. ‘드류 피어슨 화이트 대장 캠페인’이 대표적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참전군인이자 독일군 포로였던 드류 피어슨은 한국전쟁 발발 후, 한국의 고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부했다. 심지어 한때 그의 소식이 묘연해지자 그 모친이 나서 구호를 대신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대구 지역의 고아원들이 도움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선의가 모인다고 해서 일상이 평화를 되찾는 것은 아니다.

CARE의 구호품 전달 장면(출처: 뉴욕공립도서관, CARE Archives 소장)

케아 패키지 구성(출처: CARE 홈페이지 https://www.care.org)
‘자조 프로젝트’의 한계, 1회에 멈춘 구호
The Newyork Times에 대서특필되면서 국내에서도 주목받은 강원도 신철원읍의 마을은 사실 주한 케아의 ‘자조(self-help)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 1950년대 미국 정부는 원조에서 민주주의와 ‘자조’를 종종 강조하였고, 때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준을 ‘자조’에서 찾기도 하였다. 미국 원조 당국은 특별한 금전적 지원 없이 내부인들의 참여에서 이 자조를 찾으려고 했다. 그러나 한국인의 입장에서 ‘자조’란, 그저 ‘부족한 지원’에 다름 아니었다.
The Newyork Times에 나온 마을은 원래 신철원읍에서 약 4킬로미터 남쪽에 위치한 ‘○○정착마을’로서, 105세대 주민 518명이 거주했다. 그중 60세대는 상이군인 가정이고 나머지는 북한 출신의 피란민이었다. 이들은 마을을 수립하면서 주한 케아에 외부 지원을 요청했고, 마침 한국에 머물던 그래함 프렌치라는 인물을 통해 농기구나 씨앗으로 쓸 곡식은 물론 농우 15마리를 기부받았다. 당연히 마을 사람들은 고마워했다.
그러나 구호는 지속되지 않았다. 선량한 그래함 씨는 더 구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고 여겼고, 마을에 한 번 도움 준 뒤에는 구호가 더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 서구인들이 생각하는 ‘구호’란 결국 개인의 기아를 면하게 해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이란 식사 이후에도 계속된다.
이 ‘자유’ 마을 구성원의 절반은 북한 출신의 피란민이었다. 이들은 가산을 모두 잃고, 38선 접경 지역에 재배치되었다. 이는 그들의 의지가 아니며, 정부의 격리와 재배치의 결과이다. 정부는 그들이 불온하기보다는 자유의 상징이 되길 원했다. 마을의 다른 구성원인 상이군인 역시 마찬가지였다. 1950년대 상이군경에 대한 원호는 사회복지 분야 중 최대로 예산이 배정된 분야였지만, 약 13만여 명으로 추정된 이들 중 정부의 원호를 받을 수 있는 이는 3만 7천여 명에 불과했다. 데면데면한 이들이 38선 접경 지역에서 ‘자유’의 상징으로 함께 살았던 셈이다.
그러니 “미국인이 세운 한국인의 마을”로 역선전되는 그곳에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더 많았을 터다. 그러나 구호는 삶을 대신하지는 못했다. 더 이상 구호도, 원호도 받지 못한 채 마을의 곤란함은 한때의 영광을 뒤로하고 그대로 이어졌다.
전쟁 폐허 지역의 생존에서 구호보다 중요한 것
한국전쟁으로 한국은 국제사회의 막대한 구호물자를 받았다. 미국의 잉여농산물도 적지 않게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구호’는 공여자의 ‘선의’였지, 수원자의 ‘요구’는 아니었다. 자선과 박애는 귀중했지만, 그것이 삶의 본질을 대체하지는 못했다. 한국인들은 그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며 생존했다.
지금 세계를 향해 우리가 하고 있는 구호는 이 기억을 반영하고 있을까? 그래함 씨와 우리는 어느 정도의 거리에 서 있을까? 한국인들이 한국전쟁의 경험을 되새겨봐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