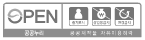동북아역사재단 2010년 10월호 뉴스레터
 송기호 서울대 교수
송기호 서울대 교수고대사는 워낙 사료가 적어서 조그만 꼬투리가 의외로 큰 연구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발해국의 위상을 밝힌 내 논문이 그러했다. 발해국은 대외적으로 왕국을 표방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황제국을 지향한 외왕내제(外王內帝)의 이중 체제를 띠고 있었던 사실을 규명해냈다. 발해가 독립국이 아니었다는 중국의 주장을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다.
이 연구의 실마리가 처음 잡힌 것은 1990년 연변을 처음 방문했을 때였다. 발해사 연구자인 방학봉 선생과 처음 2시간가량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정효공주 묘지에 문왕을 '황상(皇上)'이라 부른 것만 봐도 중국의 주장은 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도 묘지를 알고는 있었지만 이 단어에 주목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어, 황상이라 했으면 황제란 말인데' 하면서 머리 속에 담아두었다.
두 번째 실마리는 일본에서 나왔다. 황수영 선생이 펴낸 금석문 자료집에 '함화4년명 발해 석불' 명문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수록된 명문이 부실해서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다. 일본 구라시키(倉敷) 오하라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적혀 있어서,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는 후배에게 부탁하여 사진 자료를 요청했다. 보내온 흑백 사진으로도 명문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었다. 이 불상을 소개한 1992년의 논문이 이렇게 해서 나왔다.
명문에는 조문휴가 '허왕부(許王府)'란 관청에 근무했던 것으로 나왔다. 중국 남북조 연구자인 박한제 교수 연구실에 사진을 들고 갔더니 그도 '허왕부'를 먼저 지적했다. 발해에 '허왕부'가 있었으면 '허왕'으로 봉해진 인물이 있었고, 그렇다면 왕 아래에 또 다른 왕이 존재한 것이 된다. 발해왕은 황제와 같은 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당나라 '허왕부'에 근무했을 가능성은 적어 보였다.
외부에게는 '왕국', 내부에서는 '황제국'이었던 발해
1996년 초 일본 규슈대학에 머물 때 이 불상을 얘기했더니, 하마다 고사쿠(浜田耕策) 교수는 아마 가짜일 것이라고 하며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동행하여 실물을 확인했고, 진짜인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다. 일본에 있는 발해 유물을 일본학자보다 먼저 파악하는 행운을 얻은 것이다. 다만 출토지 등의 자세한 정보가 없어 아쉬웠다.
그렇지만 논문으로 탄생하기에는 좀 더 자료가 필요했다. 그런데 우연히 《신당서》 '발해전' 기록이 떠올랐다. 역사학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무심코 지나친 곳에 생각이 미친 것이다. 발해 3성의 하나로 '선조성(宣詔省)'이 있는데, '조서를 선포하는 관청'이란 뜻이니 왕의 명령을 혹시 조서라고 하지 않았을까? 마침 중대성에 속한 '조고사인(詔誥舍人)'도 오버랩되었다. 이는 조고(詔誥)를 기초하는 관직인데, '조고'는 황제의 명령이다.
여기에 눈길이 미치니 신라 하대에 설치된 '선교성(宣敎省)'이란 관청과 비교되었다. '선조성'은 조서를 다루고, '선교성'은 교서를 다루는 곳이다. 조서는 황제의 명령서이고, 교서는 왕의 명령서이다. 여기서 통일신라와 발해가 지향한 국가 위상이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작은 문틈으로 들어온 빛이 점점 방 안을 환하게 밝혀주기 시작했다. 발해는 독자적인 연호를 2대 무왕부터 계속 사용했다. 연호 사용은 원래 황제국의 특권이었고, 왕국은 황제국의 연호를 받아써야 했다. 신라는 통일 이전에 독자적인 연호를 쓰다가 당나라의 꾸지람을 듣고 포기해야 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독자적인 연호를 쓴 나라가 발해가 아닌가? 그래서 중국 역사서에서는 "사사로이"란 말을 붙여서 자신들이 인정할 수 없는 연호를 사용했다고 적지 않았나?
다시 771년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왕 스스로를 천손(天孫)이라 했다가 일본의 반발을 산 사건도 떠올랐다. 중국은 천자이고 일본은 천황인데, 발해는 고구려를 모방하여 천손이라 했다. 용어는 다를지언정 모두 하늘의 자손이요 하늘의 대리인이란 뜻이 담겨 있다. 왕으로서는 표방할 수 없는 이념이다. 발해 사신이 일본에 갈 때 지방의 수령들을 대동하고 간 것도 황제가 왕을 거느리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이러 저러한 자료들이 모아지니 비로소 논문을 구상할 수 있었다. 이리하여 1993년 3월에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황제 칭호와 관련된 발해 사료들"이란 글을 발표하게 되었다.
새로 발굴된 발해묘지 보고서에서 나온 '외왕내제'의 증거
 발해 상경용천부 황성 관청터
발해 상경용천부 황성 관청터(출처 : 조선유적유물도감)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작년 가을에 중국으로부터 학술지를 받자마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새로운 발해 묘지가 발굴되었다는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애만 태우고 있었다. 그 약보고서가 《고고(考古)》 2009년 6기에 발표 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3대 문왕의 배우자는 효의황후(孝懿皇后), 9대 간왕의 배우자는 순목황후(順穆皇后)였음이 밝혀졌다. 순목황후 묘지명에는 '간왕의 황후 태씨(泰氏)'로 적혀 있다고 한다. 남편은 왕인데 부인은 황후라는 기묘한 말이 된다. 그렇다면 부인의 위상이 더 높았는가? 그것은 아니다. 발해왕은 왕이라 부르되 황제와 같은 존재였다. 다만 강대국인 당나라를 의식하여 왕이라 칭하고 조공하면서도 내부적으로 황제국 체제를 취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외왕내제의' 국가 모습이다. 오래전에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이 먼 훗날 선명하게 증명되었으니, 연구자의 보람은 이런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발해만 이중체제를 취했던 것은 아니다. 고려도 왕국이면서 왕 아래에 여러 왕을 두었다. 조선 초기에 《고려사》를 편찬하면서 당혹스러워 했던 것이, 고려시대가 사용한 황제적인 용어였을 정도로 스스로 황제국을 운영했다. 이러한 고려의 제도는 아마 발해에서 배워온 것이리라.
우리나라는 역대로 중국에 사대했던 통일신라와 조선, 그리고 이중적 태도를 취했던 발해와 고려로 양분된다. 대내외에 황제국을 천명했던 시절은 대한제국이나 반란 때로 한정되어서 우리 외교의 주류는 아니었다. 우리가 중국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고민스러운 이때에 한 번 되돌아볼 만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