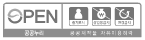동북아역사재단 2015년 08월호 뉴스레터

2015년 8월은 제2차 세계대전이 아시아에서 끝난 지 70주년을 맞는다. 인류는 지난날의 과오를 통해 인간이 살아갈 만한 새로운 세상을 향해 새 역사를 열어왔다. 아시아보다 석 달 남짓 먼저 종전한 유럽에서는 전쟁의 재발을 막고, 역사적 도약을 위해 공동의 가치에 따른 새로운 공동체들을 만들었다. 이 공동체들 중에서 유럽인권체계는 인류가 만든 그 어떤 제도적 장치들보다 의의가 있다.
당시 서유럽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도발한 나라들이 자국민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전쟁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인권을 존중하는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호전적인 독일과 연합국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 여러 국가들이 공동의 가치에 따라 지역통합을 이루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1949년 유럽심의회(Council of Europe)와 1952년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를 각각 탄생시켰고, 1950년 유럽인권협약을 채택한 것이다. 그런데 아시아는 어떠한가?
아시아 근·현대 역사에서도 대규모 조직적 인권침해 사례는 적지 않았다. 그런데 일제가 조선을 침략하면서 저질렀던 잔혹한 인명살상은 세계사에 크게 부각되어 있지 못하다. 제1차 세계대전 개전과 함께 신생 터키 정부가 저지른 최소한 80만~100만 명의 아르메니아 민족 집단학살, 1937년에 일본 군국주의 정부가 저지른 남경대학살(우 테인 웨이 미국 일리노이대 명예교수가 계산한 최소 34만 명~중국 측 매장기록에 나타난 22만 7천 4백 명과 오타 하사오 일본 육군 소령의 고백서에 보이는 15만 명을 합산하여 최대 37만 7천 4백 명) 등은 아시아에 인권보호제도를 만드는 데 활용되지 못했다.
냉전에 묻힌 아시아 근·현대사의 인권침해 문제
오늘날 아베 정부가 역사를 부정하고, 심지어 날조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동아시아에서 일제에게 심대한 피해를 입은 국가들의 목소리가 동서냉전 상황에 묻혀버렸고, 제2차 세계대전이 동아시아 피해국 중심이 아닌 서양 승전국 중심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피해국들이 냉전 상황을 거의 종식시켰고, GDP가 세계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만큼 경제성장도 이룩하였다. 이제는 피해국들이 지난 70년과 다른 새롭고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일본의 잘못된 역사 인식과 책임 부정, 동북공정(東北工程) 같은 중국의 역사 날조는 한 치의 틈도 주지 말고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반박해야 한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동아시아 국가들을 공동의 가치에 따라 지역적으로 통합시킬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유럽통합의 아버지 쟝 모네(Jean Monnet)는 “국가 간 협력 없이는 평화가 없고, 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광복 70주년을 동아시아에 인권공동체 즉, 동아시아 인권보호체계를 만드는 데 대한민국이 기수(旗手)가 되는 원년으로 삼으면 어떨까?
유럽, 미주, 아프리카 대륙에 갖춰져 있는 지역인권보호체계가 유일하게 아시아 대륙에만 없는 데에는 그만한 장애요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장애요인들 중 역내 국가들의 정치적 의지 결여, 강한 국가주권주의와 타국의 내부문제에 대한 불개입 전통 등은 범세계적 국제기구나 역외 국제기구의 개입, 비정부기구들(NGOs)의 촉구로 개선될 수 있다. 국가들 간의 상이성(heterogeneity) 문제는 세계화, 지역경제 블록의 활성화 등을 통한 보편성 확보로 극복될 수 있다. 그리고 역내 특정 국가의 인권침해가 분규 발생과 제재를 초래할 것에 대한 우려도 신뢰구축으로 극복될 수 있다. 물론 종교와 가치의 문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겠지만, 이 지역의 근대화와 더불어 그 비중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장애요인들을 생각하면 아시아에서는 하위지역 차원의 체계 마련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측면에서 동북아시아가 가장 낙후된 지역이다. 국가주권주의가 강하고 북한, 중국 등의 전체주의 이념이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구조적으로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정치적 다원주의와 민주화가 선행되지 않고는 지역적 인권보호장치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데 유럽의 초기 상황을 보면 동북아시아에서도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즉, 유럽공동체와 다른 조약기구들이 주로 정부차원으로 구성되어 제정법과 판례법(legislation and case law)이 발전 초기 단계에 있었을 때, 인권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될 어떤 법조문도 명백히 문구화 되지 못했고, 그렇게 보이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유럽인권보호체계의 기초가 되는 1957년 로마조약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동일한 일에 대해 동일한 급료를 받을 권리', '자유로운 이동의 권리'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들의 일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세안 지역포럼에서 인권의제 채택 논의를
동북아시아에서는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모델을 받아들여 그간 논의되어 왔던 동북아다자안보협력회의(혹은 협의체)에서 인권문제를 다루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 아세안 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에서 인권문제를 의제로 채택해 포럼의 발전과 더불어 확대·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특히, 여성·아동의 권리 등 비교적 쉽게 공감할 수 있는 특정 주제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동북아에 국가주권주의가 팽배해 있고, 동북아다자안보협력회의(협의체)가 현실화 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을 고려하면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게 독려하여 이 기관을 활동주체로 하고, 비정부단체들이 감시와 정보·자료 제공 등을 통해 협력·보완해 나아가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유럽의 지역인권보호체계는 다양성을 종합한 역사적 미봉(彌縫)이고, 현재까지도 협상이 진행 중인 사안이다. 아시아의 다양성도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유럽처럼 대화와 협상을 통해 미봉될 수 있는 대상임을 기억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