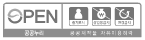동북아역사재단 2014년 11월호 뉴스레터
 재단의 외국인 역사아카데미에 참여한 세계각지에서 온 외국인들
재단의 외국인 역사아카데미에 참여한 세계각지에서 온 외국인들2004년 5월 23일, 프랑스 지중해 연안의 한 고요한 휴양 도시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다수의 프랑스 사람들에게 본국을 알리는 데 큰 성과를 거둔다. 이 날은 제57회 칸 국제영화제 폐막식에서 박찬욱 감독이 그랑프리(심사위원대상)를 수상하여 팔레 데 페스티발(Palais des Festivals) 무대에 오른날이다.
미지의 세계, 한국
필자 또래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중반 사람들에게 "한국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한국에 관심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고 물어보면 "한국 영화 때문"이라는 대답을 꽤 많이 들을 수 있을 것이다. 필자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영화 매체를 통해, 여태까지 지도에서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접할 기회가 희박했던 '미지의 세계' 한국에 관심이 생겼고, 한국이 향후 10년 간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4년 현재, 많은 젊은 유럽인들은 한국영화가 아니라 한국 음악을 통해 처음 한국이라는 나라를 접하고 있다. 비록 매체는 달라도 한국을 접하는 과정은 비슷하다. 우연, 지인의 추천, 마케팅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그 문화를 통해서 어떤 미지의 세계를 발견한 것이다. 물론 영화, 음악, 그 특정한 문화요소를 즐기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둘러싸고 뒷받침하고 있는 한국 사회와 역사 등으로 관심이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단지 문화를 소비하는 것을 떠나 미지의 세계로 넘어가는 데는 무엇이든 추가 요소가 필요하다. "한국영화가 좋아서 한국으로 왔다"고 한다면 너무 단순한 설명이기 때문이다. 추가 요소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주로 젊은이들의 마르지 않는 호기심, 모험 정신, 미지의 세계에 대한 환상들이 아닐까 싶다.
프랑스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다. "다른 곳의 풀이 더 푸르게 보인다" 아마 그런 환상을 품고 한국에 온 사람들이 한 두명이 아닐 것이다. 언젠가는 환상이 깨지기 마련이지만 환상 없이는 따분한 현실에만 갇혀 있을 위험도 있다. 필자는 그것을 일찍 깨달았다.<,/p>
끝없는 학업 생활에 지쳐 있던 나는 스무 살이 되던 해에 한국에 가게 될 기회를 얻었다. 필자가 다니던 국립대학교에서는 지방의 재정지원으로 대학생들을 해외로 보내 경험을 쌓고 오게끔 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었다. 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한다. 한 학기 동안 한국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구석구석 탐방하고 조국으로 돌아오기로 한 것이다.
2008년 8월 2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인생 두 번째로 한국 입국 절차를 밟았다. 첫 방문 후 3년만이다. 그동안 한국에 다시 돌아오리라는 것을 결코 의심치 않았다. 그래도 두 번째 방문에는 싱숭생숭한 느낌이 들었다. 돌아가는 표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다른 곳의 풀이 더 푸르게 보인다거나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해도 가족, 친구, 일상생활과의 작별인사는 그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막상 공항에서 나와 목적지에 다다르면서 고국에 대한 향수는 다시 증발해 버린다. 오히려 첫 방문 때에 탐방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한국이 반갑다. 오랜만에 매운 음식 때문에 고생을 할 것이고,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에서 곧 다가올 가을의 경치를 감상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이른바 '지중해성 기질', 즉 다혈질에 또 한 번 놀랄 것이다.
한국 문화에 관한 관심을 넘어 한국 사회로

한국이 유럽 사람들에게 '아시아의 이탈리아'라고 불리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두 나라 모두 삼면이 바다로 둘러 싸인 반도라는 점, 둘째는 가족 구성원들끼리 서로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이다. 그런데 필자가 이야기 하고 싶은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 바로 사람들의 성격이다. 그 점을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길거리에서다. 누구나 운전을 하면 자신의 본성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미 수차례 언급했겠지만, 한국인의 성격은 급하다. 길거리에서든지 식당에서든지 한국 사람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삶을 살아간다. 느긋하게 사는 것으로 유명한 프랑스에서 온 필자는 이에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문화 충격, '모험 정신'이나 생소함에서 오는 '호기심'으로 미지의 세계로 온 사람에게 이런 광경은 그야말로 '마약'이나 다름이 없다. 외국에 나가 사는 초기 단계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은 모든 기이한 경험과 자신의 상식을 깨뜨리는 상황을 스릴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그러한 문화충격은 '마약'이니만큼 언젠가는 악영향도 따라오기 마련이다.
'문화충격(Culture Shock)'은 1951년 미국 인류학자 코라 뒤부아(Cora DuBois)가 다수 인류학자들이 낯선 문화를 접할때 겪는 혼란스러운 경험을 가리키기 위해 처음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1994년에 윈클맨(Winkelman)은 문화충격을 문화도취(허니문단계), 문화대면(위기단계), 문화적응(타협단계), 문화순응(수용단계) 등 4단계로 나누었다. 여기서 두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의 간격은 매우 크다. 그 간격을 뛰어넘으려면 무엇보다 열린 마음,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의미있는 만남이 필요하다.
이제 한국생활 10년차로 접어드는 현재, 생각해 보건데 10년 전 갖고 있던 환상과 지금 필자가 한국을 바라보는 이미지는 많이 바뀌었다. 광화문 일대를 누비며 한껏 들떠 있는 관광객들을 보면, 내가 언제 저랬었나 싶을 정도로 광화문은 필자에겐 그저 회사 옆 광장일 뿐이다. '시위가 많은 곳'이라는 정도랄까? 이렇게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이유는 내가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는 월급쟁이이기 때문이리라. 아니면 이미 내게 프랑스가 벌써 '다른 곳의 풀' 내지는 '남의 떡'이 되어버린 것일 지도 모른다.